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피플&칼럼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이상한 물음이다. 대(大)와 학(學), 큰 배움은 둘째치고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구로 여겨진다. 비싼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해 얻은 학위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의 필수 요소가 된 프랑스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학이 여전히 제기능을 하는 프랑스에서 나는 ‘취업 양성소’ 그 이상의 가치를 본다.

‘간택’과 ‘선택’의 차이
한국의 고등학생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같은 길 위에서 경쟁한다. 덜 좋은 대학에 가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아닌 실패자라는 느낌을 받는다. 프랑스 입시는 어떨까?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은 내가 갈 대학을 내 의지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점수에 의해 선택되느냐다. 68혁명 이후 프랑스의 모든 국·공립대학은 평준화되어 대학 입학 시험 ‘바칼로레아’를 합격한 모든 학생에게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 일정 점수만 넘으면 통과 가능한 바칼로레아는 ‘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가’만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한국의 서열화된 ‘등급제’와는 다르다. 게다가 평준화된 국·공립대학은 지원한 학생이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만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평등한 학생과 대학 그리고 공평한 기회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입시 제도는 좋은 대학에 간택되기 위해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 우리 정서에는 뭔가 낯설다. 바칼로레아의 합격률은 매년 85%를 웃돌지만 정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합격자의 50% 정도다. 학위가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구일지라도 졸업장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학할 학교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들에게 대학은 취업 시장의 경쟁력이기 이전에 배움과 진리의 전당이 된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대입에서 승자도 패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보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프랑스
혹자는 프랑스의 평등한 교육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한다. 평준화된 국립대학 위에 그랑 제콜, 즉 엘리트 양성 기관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계, 정계를 비롯해 프랑스의 유력인사 중 그랑제콜 출신이 아닌 사람은 찾기 힘들다. 게다가 그랑제콜 출신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 역시 같은 학교 진학을 준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 세대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사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더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나라다. 하지만 동시에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삶’ 이 있는 곳이다. 명문 학교에 갈 능력은 둘째치고 그랑제콜 진학을 꿈꾸는 프랑스 학생은 극소수다. 모두가 최고 대학의 인기 학과를 목표로 경쟁하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야기일 것이다. 기업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에 무리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사회에서도 지금의 한국처럼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 대기업 취직과 높은 연봉이 행복한 삶의 표준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사회에는 더 다양한 행복의 기준이 존재한다. 흥미 있는 학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아 성취를 이룬다면 그랑제콜 출신 엘리트의 삶이 부럽지 않다고 프랑스 동기들은 말한다. 탄탄한 복지국가답게 최소한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도 이같은 선택이 가능한 이유다. 그랑제콜에 가지 않아도, 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질문에 ‘큰 배움을 위해서’라는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심화된 학문 맛보고 선택할 자유 주는 프랑스 대학
며칠 전 파리1대학 철학과 1학년 성적표를 받았다. 입학 당시의 걱정과 달리 유급 없이 성공적으로 첫 학년을 마칠 수 있었다. 1년간 반 이상의 철학과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공을 바꾸는 것을 목격했다. 프랑스 대학에서는 첫 학기 이후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학과의 수업 하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진학 이후에도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보장되며 다른 학문의 매력을 알아갈 여지를 두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대학 전공 선택이 평생의 삶을 결정하는 무거운 선택으로 작용한다. 수험생활 동안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갓 성인이 된 프랑스 학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방황하기 때문에 대학에 간다. 심화된 학문을 맛보고 선택할 자유가 대학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까? 프랑스의 국·공립대학은 공부 능력이 완성된 똑똑한 학생을 맞이하는 기관이 아니다.
학문에 매료시키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존하는 프랑스 대학에서 우리는 학문 그 이상을 배운다.

1. 800년 역사의 소르본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뛴다.
2. 소르본 건물 앞의 몽테뉴 동상. 발을 만지면 공부 운이 좋다는 소문 때문인지 금색으로 반질반질하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3. 마크롱의 대입 개혁을 반대하는 학생 파업. 투표 결과 2학기 시험이 취소됐다.
4.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파리1대학의 아이콘 ‘게바라’가 신문에 나왔다.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진 (철학) sirongsae@gmail.com
- GLOBAL EDU 유학생 해외통신원 (2018년 07월 04일 86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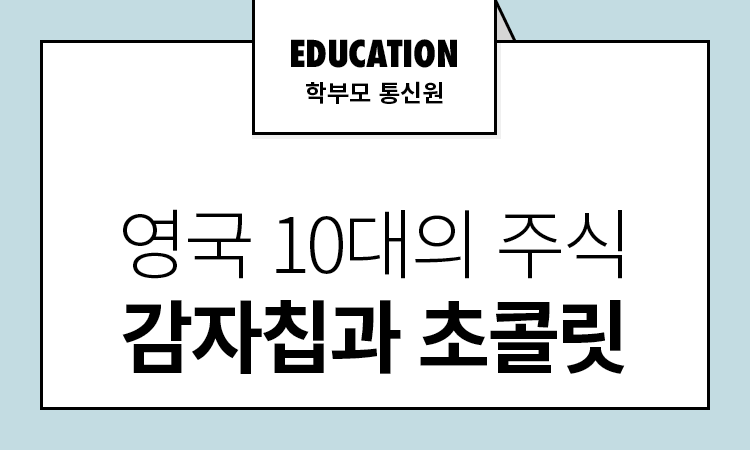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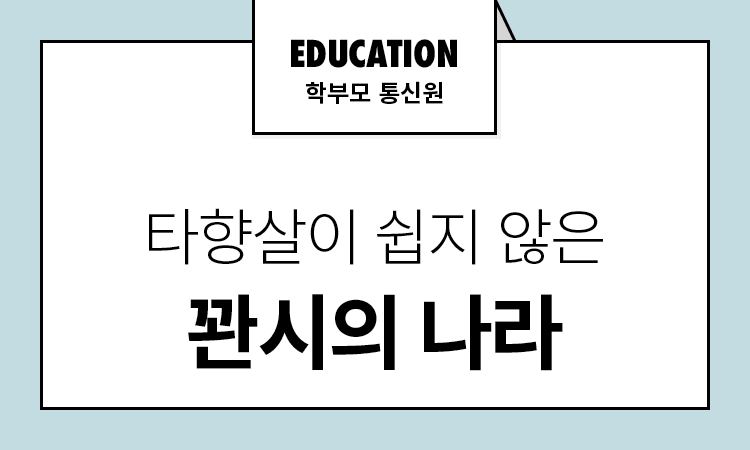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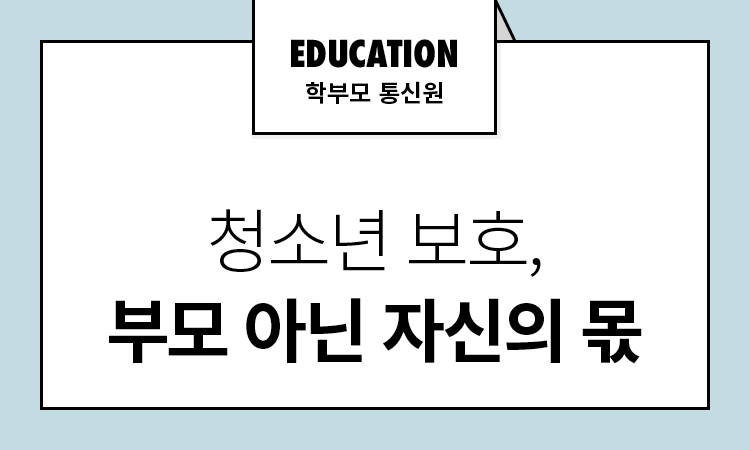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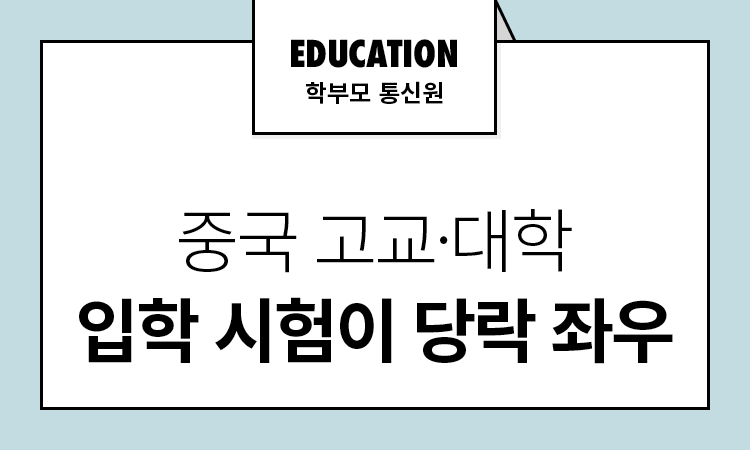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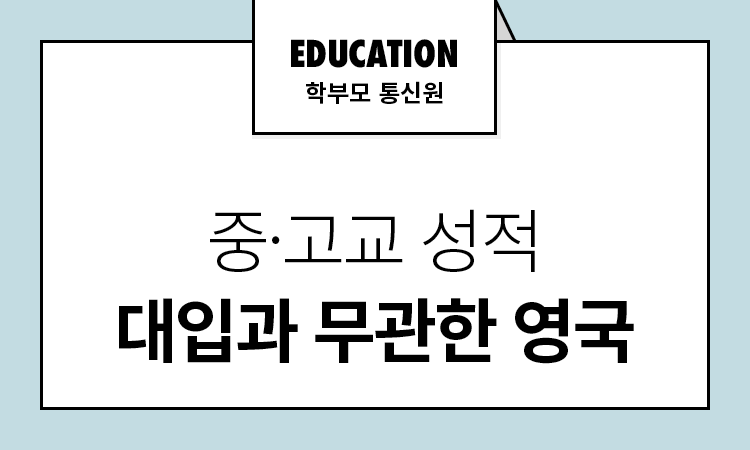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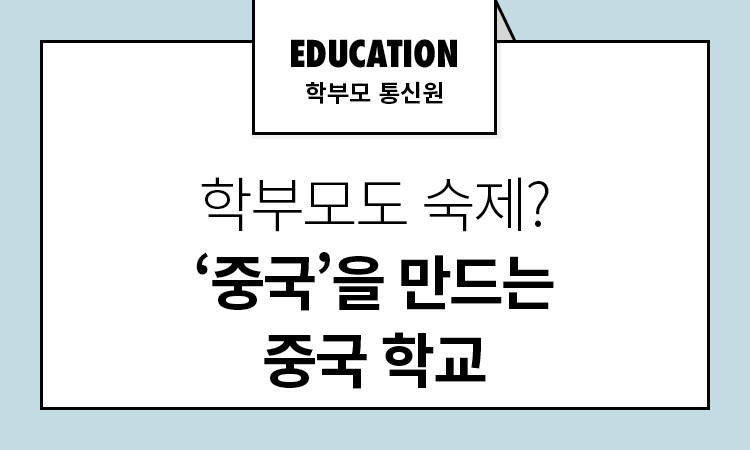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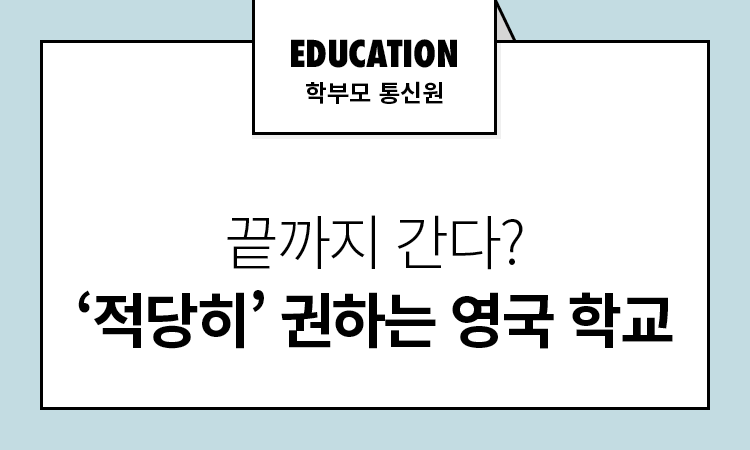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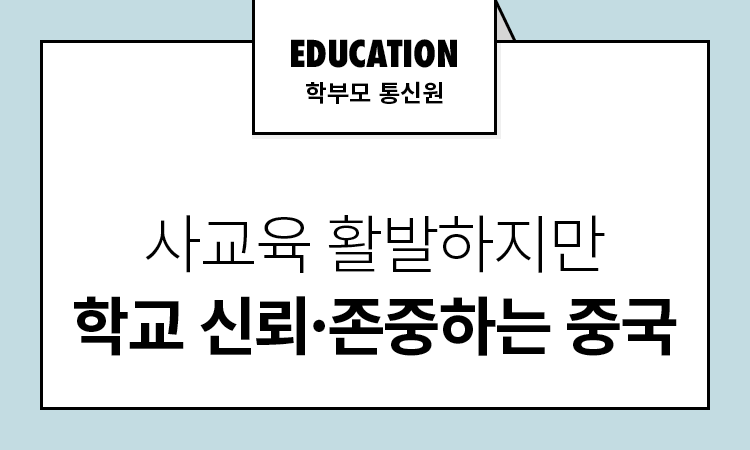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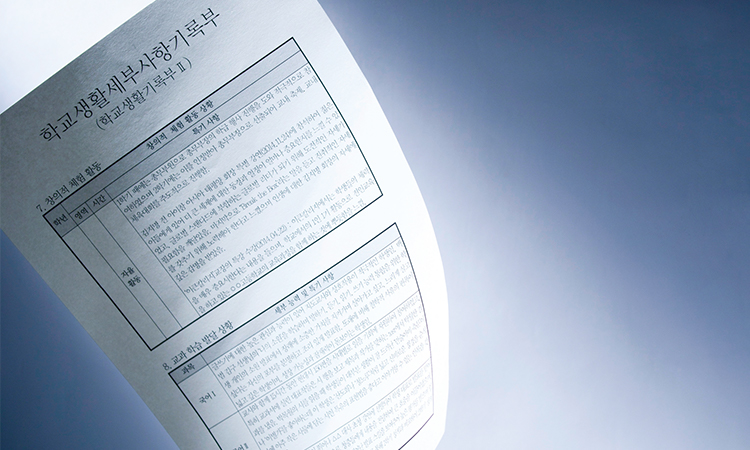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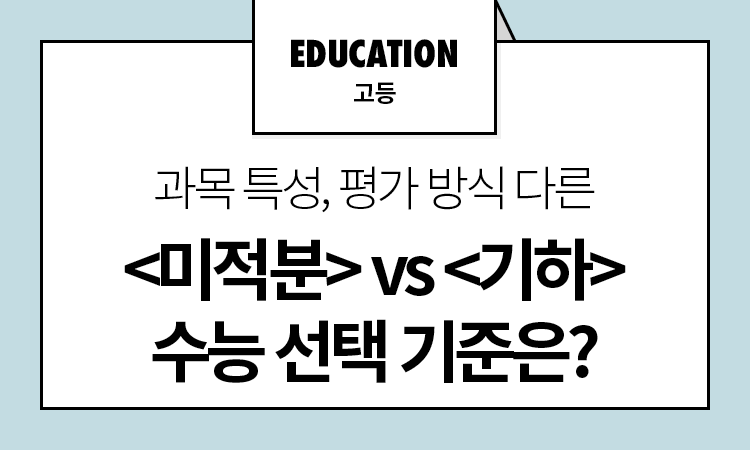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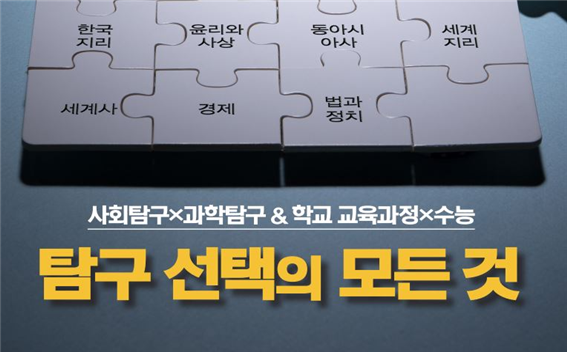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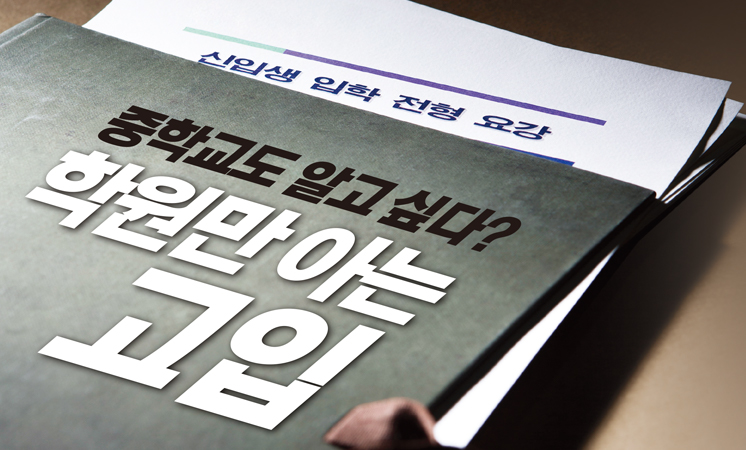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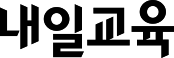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