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피플&칼럼



한국에서 나는 눈에 띄거나 유별난 행동을 조심했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주로 만났다. 반면 개인의 성향이 다름을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친구들과 만났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유학을 통해 나는 위축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찾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생각에 솔직할 수 있었던 시간들
처음 미국에 적응할 때 멕시코계 미국인 에릭의 도움이 컸다. 음악 밴드의 리더였던 에릭은 복도에서 나를 보고 밴드에 들어와 베이스드럼을 칠 것을 제안했다. 그 당시 나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다음 수업 때문에 “예스예스”라고 대답했던 것 같다. 그 계기로 내 몸집만 한 드럼을 어깨에 메고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나중에 베이스드럼을 제안한 이유를 물으니, 덩치가 커서 뽑았다고 해 서로 웃었다. 밴드 활동으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됐고, 유학 초기의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었다.
한 번은 학교 미식축구 경기가 끝나고 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 보통 멕시코 음식이라고 하면 타코나 브리또를 생각하는데 이날 먹은 음식은 처음 경험하는 맛이었다.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내 앞에 놓인 음식을 삼키듯 먹었다. 옥수수를 푹 끓인 듯한 음식을 겨우 비워갈 즈음 에릭의 어머니는 한 그릇 더 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어른이 주는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던 나는 그렇게 낯선 음식을 한 그릇 더 먹었다. 그 친구에게 그 음식의 맛을 솔직하게 말하며 그럼에도 두 그릇을 먹은 이유가 한국의 식문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 친구는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도 이해했을 거라고 말했다. 음식은 단편적인 사례지만, 나는 한국에서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살았다. 예의를 떠나 지금은 내 생각과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신경 쓰지 마, 넌 너야!
유학을 와서 영어 이름이 없어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했다. 한 번은 학교 안내방송에서 어떤 사람을 계속 찾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몰라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이크는 웃으면서 영어 이름을 만들 것을 권유하며 필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제이크와의 인연은 학교가 아닌 방과 후 전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처럼 집으로 향하는 길에 멋진 정장을 입은채 자전거를 탄 청년이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한두 마디 나누다 보니 같은 학교 학생임을 알았고, 공립학교로 전학을 와서 친구가 없었던 터라 먼저 말을 걸어준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상치 않은 그들의 복장이 눈에 들어왔다. 왜 항상 정장을 입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몰몬교 신자라며 종교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종교라 순간 겁이 났지만 소수가 믿는 종교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문제의 답이 왜 1이야?” “글쎄, 나도 몰라”
지겨운 SAT 공부를 마치고 대학 입학 원서를 썼는데 내가 다닌 학교 한 군데에서만 입학 허가를 받았다. 재수가 싫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기에 마냥 좋지는 않았다. 마음을 다잡았지만 대학 발표가 나고 연필을 내려놓은 지 8개월이 넘었던 터라 쉽지 않았다.
그때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만든 스터디 그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험 때가 되면 친구들의 공부 스타일이 드러났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그룹 중 내가 가장 똑똑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어느 순간 친구들의 숙제와 시험 공부를 도와주고 질문에 대답하는 입장이 됐는데, 가끔 친구들은 내 대답에 미심쩍어했다. 그들은 내가 구한 답의 이유를 듣고 싶어했는데 나는 그 이유를 매번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노아라는 친구가 “필립, 너랑 숙제할 때면 답이 빨리 나와 좋긴 한데 이유는 몰라서 답답하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는 답을 알거나 외우고 있으면 원리는 나중에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입학 2년만에 생각이 바뀌었다. 배우는 내용의 난도가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공부가 더 효율적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기른 노아는 나보다 더 빠르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내가 이 친구의 도움을 받곤 했다.
미국 유학이 끝나고 그리웠던 한국에 온 지 2주 정도 됐다. 막상 돌아오니 어색함이 맴돈다. 7년이라는 긴 유학 기간 때문인지 한국의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존버’나 ‘갑분싸’ 등의 줄임말에 문화 충격을 받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적응기를 겪는 중이다.

1. 몰몬교 친구 제이크와 함께 애리조나에 있는 캐멀백 마운틴에 올랐다.
정상에서 쉬면서 찍은 사진이다. 이때 처음으로 정장을 입지 않은 친구의 모습을 봤다.
2. 몰몬교는 보통 2인 1조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
보통은 각각 분리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가끔은 결합한 자전거도 만난다.
3. 왼쪽에서 두 번째 친구가 노아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학생이었던 노아는 대학도 높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4. 생각하기도 싫은 맛을 냈던 멕시코 음식, 콘수프. 다음에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친구의 어머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권하지 않으셨다.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승제(토목공학) spark670@gatech.edu
- GLOBAL EDU 유학생 해외통신원 (2019년 01월 16일 89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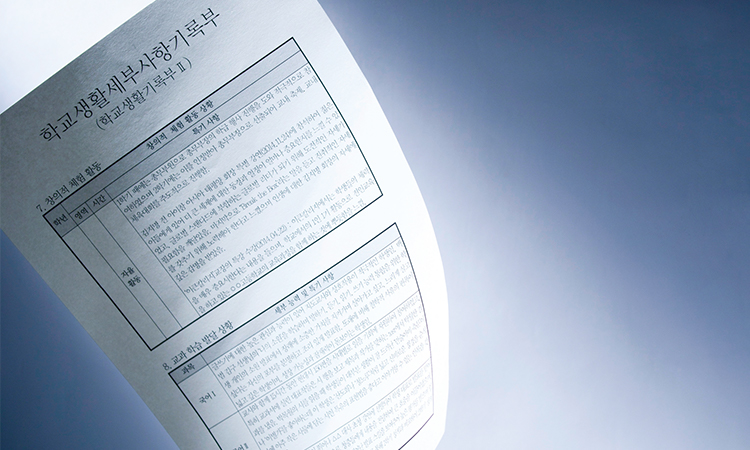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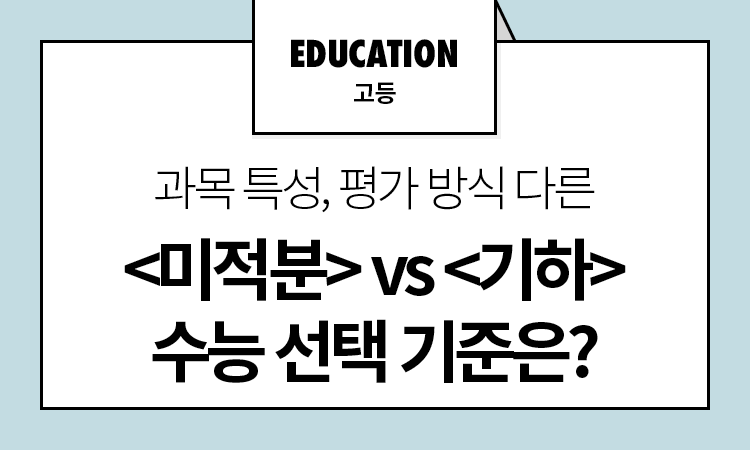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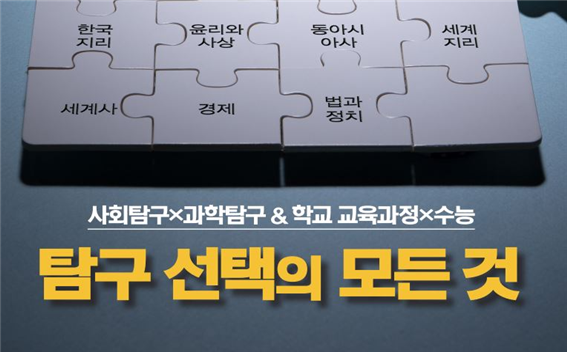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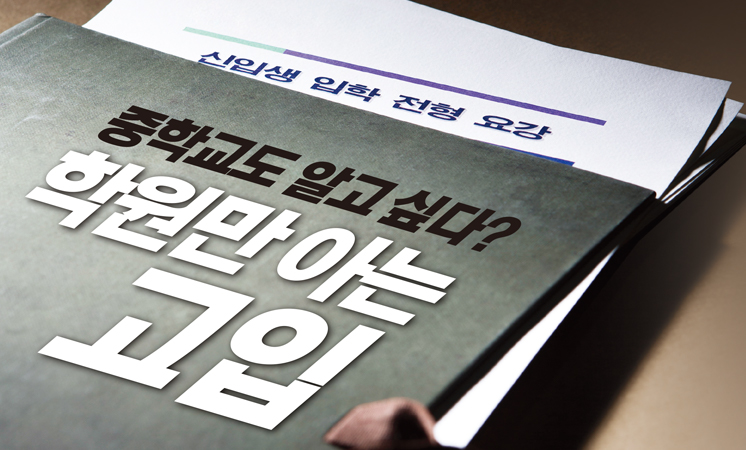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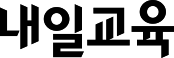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