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피플&칼럼

프랑스에서 마주한 노동의 가치
19세기 탄광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에밀졸라의 소설 <제르미날>에서 볼 수 있듯, 프랑스의 ‘파업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운행이 멈춘 열차 앞에서 프랑스인들은 당황하지 않고 등을 돌리며 한마디를 부르짖는다. “아, 또!” 학교에서도 인적 없는 행정실 앞에 걸린 ‘파업 중’이라는 안내판을 심심찮게 마주한다. 이 나라의 서비스업에서 한국의 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철저하게 노동자 중심인 프랑스 사회에서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먹힐 리가 없다. 답답한 마음에 프랑스 친구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었다.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꾼 그의 대답은 “그들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였다.
프랑스 노동법은 철저히 근로자 중심이다. 근로 시간을 예로 들면 최근 주 52시간으로 ‘줄어든’ 한국의 시각에서는 35시간을 일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게을러 보일 수도 있다. 한 예로 프랑스는 저녁 7시만 돼도 문을 닫는 상점이 즐비하다. 고용주는 이익 감소의 이유로 직원을 쉽사리 해고할 수도 없다.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단체인 CGT를 앞세워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을 하고 집회를 자주 여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게 생소했던 풍경은 바로 ‘타인의 노동에 대한 프랑스인의 시선’이었다.
나의 여유가 중요하듯 타인의 여유 존중해야
국가가 쉽사리 노동법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한다. 눈앞의 직원이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밤에도 문을 닫지 않는 상점이 있다면 편리하다는 것을 프랑스 사람들도 안다. 하지만 내게 일요일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일요일이 있어야 하며, 일하는 타인의 여유가 곧 나의 여유를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한국처럼 서비스직과 소비자 사이에 ‘갑을 관계’는 없다. 노동은 신성하며, 그 신성함은 스스로가 타인의 노동까지 존중해줄 때 완성된다는 진리를 프랑스에 와서야 깨달았다.
가끔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도를 지나친다는 인상도 받는다.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종이로 된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이나 그로 인한 비효율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변화에 인색하다. 전쟁 이후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인의 입장에서, ‘가장 프랑스다운 것’ 을 고수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나라에서 사는 일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프랑스는 과연 변화를 거부하면서도 이민자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 사회가 앓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라난 곳과 다른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타지에서 얻는 배움, 즉 유학이 주는 값진 경험 아닐까.
더워서 시위하는 프랑스인, 우리는 불평하는 인간
유난히 더웠던 여름, 파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무더운 여름을 보냈던 한국이라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소리치기보다는 집에 에어컨을 장만하는 등 현실적인 대처를 빠르게 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불합리한 사건에 저항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경험했던 노동법 개혁 반대 시위, 철도 파업, 대입 제도 개혁 반대 집회 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공동체에서 터져나온 불만에 귀 기울이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면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프랑스 유학은 겉도는 방관자에 불과했던 나를 거리낌없이 시위 행렬에 발걸음을 함께할 정도의 주체적 개인으로 성장시켰다.
프랑스로 유학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지식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저항하는 지식인’처럼 사유와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신념을 표현할 기회를 자주 얻는다. ‘불편한 나라’에 살며 ‘불평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나를 발견한다.

1. 지난달 파리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 ‘위험에 처한 북극곰은 싫다’고 쓰인 피켓을 든 아이와 아버지의 모습이 인상 깊다.
2. 19세기 탄광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소설 <제르미날>을 쓴 에밀 졸라는 프랑스 지식인 사회 참여의 모델이 됐다. 간첩 누명을 쓴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서한을 쓴 바 있다.
3. 2015년 잡지사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은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지지자들이 총격 테러를 가했다. 당시 모두가 “Je suis Charlie(나는 샤를리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추모했다.
4. ‘소르본 학생이여, 성가신 놈이 되어라!’ 지난봄 대입 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시위에 사용된 문구. 젊은 프랑스 학생들의 반항 정신이 엿보인다.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진 (철학) sirongsae@gmail.com
- GLOBAL EDU 유학생 해외통신원 (2018년 11월 07일 88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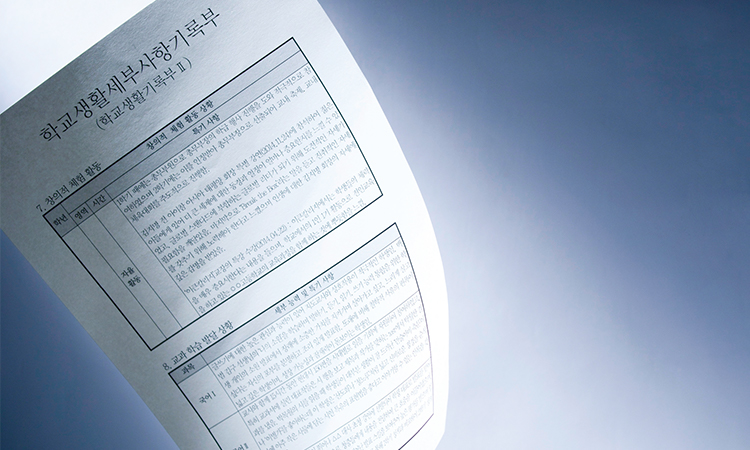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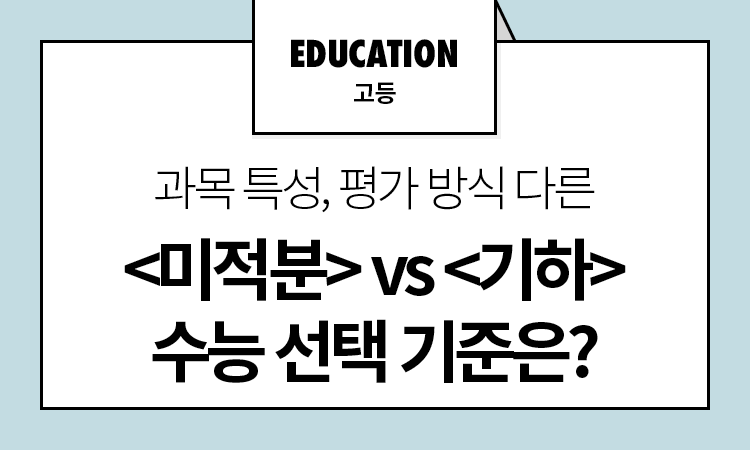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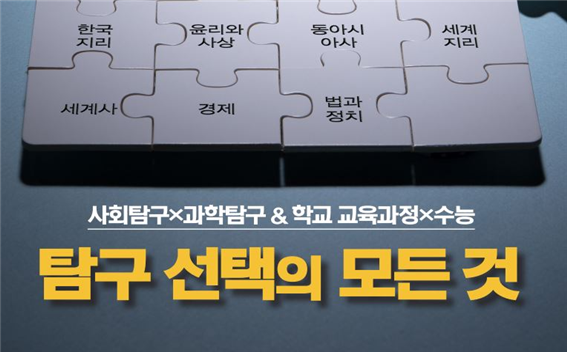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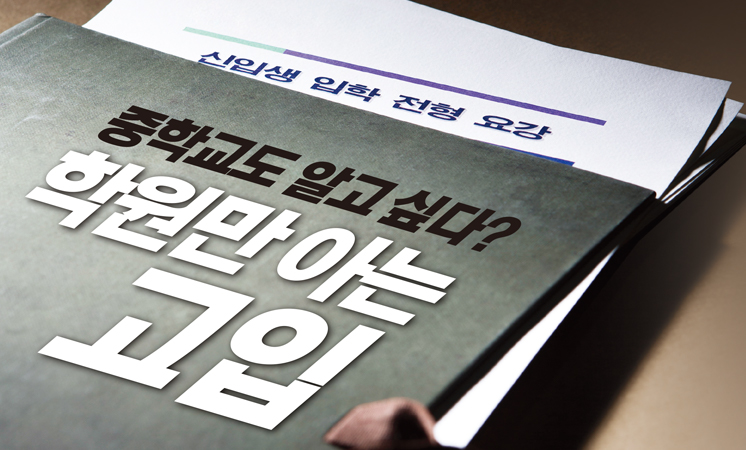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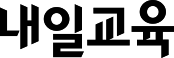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