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피플&칼럼



공부에 뜻을 품고 떠난 유학생활도 잘 챙겨 먹고, 신나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나눌 친구들이 있을 때 큰 그림이 완성된다. 다른 문화권의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어 실력이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손짓 발짓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전부였다. 말을 못하는 게 대수인가? 중요한 것은 ‘진심’일 뿐, 언어적 장벽이나 다름이 우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타국에서 힘이 돼준 친구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을 주로 만났다. 외국인을 낯설지 않게 바라보고 의사소통할 때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프랑스인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오랜 친구 Justin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동갑내기 학생이다. 3년 전 룸메이트였는데,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좋은 친구가 됐다. 지금은 연애, 학업,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나눌 수 있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
Justin은 내가 처음 만난 채식주의자 친구이기도 하다. 그가 달걀과 생크림으로 속을 채우는 키쉬라는 파이를 요리해준 적이 있었는데, 고기 없이 못 사는 나를 위해 파이의 반에는 돼지고기를 넣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어 놀랐다. 일반적이지 않은 신념을 가졌을 때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는, 나의 자랑스러운 동갑내기 친구이다.
인터넷 세대이기에 찾을 수 있었던 닮음
이름이 프랑스어로 ‘천사’라는 뜻인 Ange는 이름 그대로 천사 같은 친구이다. 프랑스어로 쓴 과제를 교정봐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울할 때마다 꽃을 선물하거나 친구들을 모아 파티를 열어주는 나의 정신적 지주이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전혀 다른 우리가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유년시절의 공유였다. 그가 어릴 적 다녔던 학교와 동네를 그와 함께 둘러보며 들었던 얘기는 나만큼이나 괴짜였을 프랑스 소년을 상상하게 했다.
나 또한 고등학생 시절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12시간 넘도록 학교에 있었던 나날을 묘사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밤새워 이야기하고, 1960년대 록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다. 인터넷의 특혜를 입은 세대답게 지금의 자아를 완성한 것은 세계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의 힘이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닮음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준 것이다.
서로 다르기에 더 진~했던 우정
인종의 용광로와도 같은 파리이기에 같은 처지에 있는 각국의 이방인들과 우정을 쌓을 기회가 많았다. 어학원에서 만난 일본인 히피 커플, 에콰도르 출신의 인자한 아주머니, 철학과에서 만난 수다쟁이 스페인 청년 등 프랑스 속의 ‘주변인’ 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진 고충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방인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흐른다.
내가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 만났던 사회는 모로코인 전 남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아랍계 이방인들이었다. 잇따른 테러로 아랍인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프랑스 사회답게 그들이 겪는 차별과 고충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이 보이면 수색을 당하거나 연행됐다. 동양인인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영혼을 갉아먹는지 공감할 수 있었다.
동병상련으로 이어진 우정은 서로를 알아가며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탈바꿈한다. 대화를 통해 문화를 엿볼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된다. 나 또한 유학을 와서야 한국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며 얻은 생생한 이야기는 유학 생활의 큰 자산이다. 유학을 하며 배운 것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건배’ 를 외치는 법이라고 해도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프랑스에 살며 프랑스인처럼 된다기보다는, 세계인으로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나이에 개의치 않고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프랑스어에도 분명히 ‘Vous’라는 상대방을 칭하는 존댓말이 있다. 하지만 존댓말을 쓸 때 ‘나는’이 ‘저는’으로 바뀌는 한국과 달리 화자에 따라 자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은 남을 존중하기 위해 나를 낮추지만, 프랑스는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써도 나는 언제나 Je, ‘나’로 머문다. 한국사회는 대화 속에 상대방과 나의 수직관계를 끊임없이 드러내지만 프랑스에서는 나를 낮추지 않고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과 얘기할 때 더 자유롭다고 느낀다. 나이나 친한 정도에 따라 존댓말을 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화는 평등을 기반으로 시작한다. 진정한 존중은 그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1. Justin과 그의 친구 Lena. 수업이 끝난 뒤 가벼운 이야기부터 진지한 이야기까지 대화가 오가는 파리의 저녁.
2. 2년 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암스테르담.
우정 여행으로 유럽을 다닐 수 있다는 점 또한 프랑스 유학의 장점이다.
3. 동기들과 함께한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대학생활을 하며 동지애로 맺어진 우정이 많았다.
4. 거리의 화가가 그려준 나와 프랑스 친구 초상화.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진 (철학) sirongsae@gmail.com
- GLOBAL EDU 유학생 해외통신원 (2019년 01월 09일 89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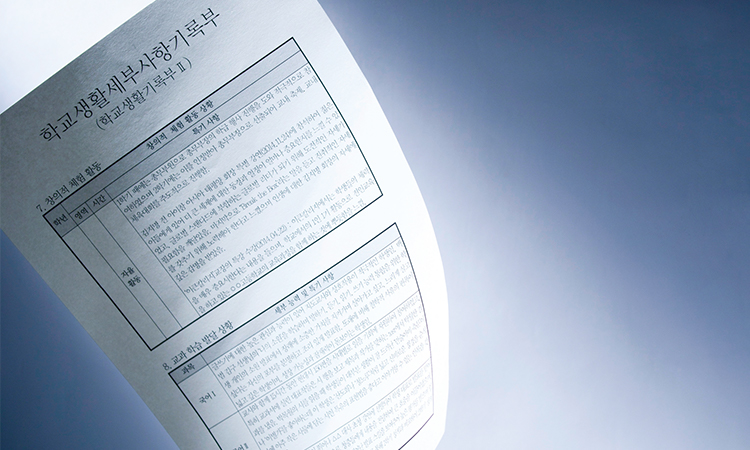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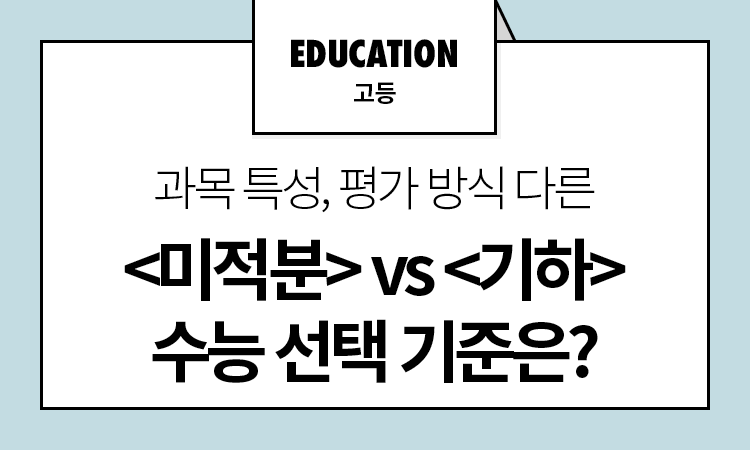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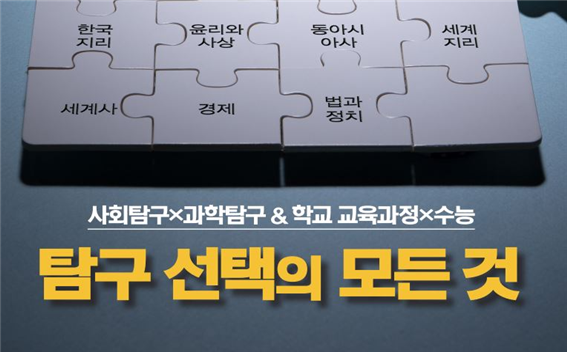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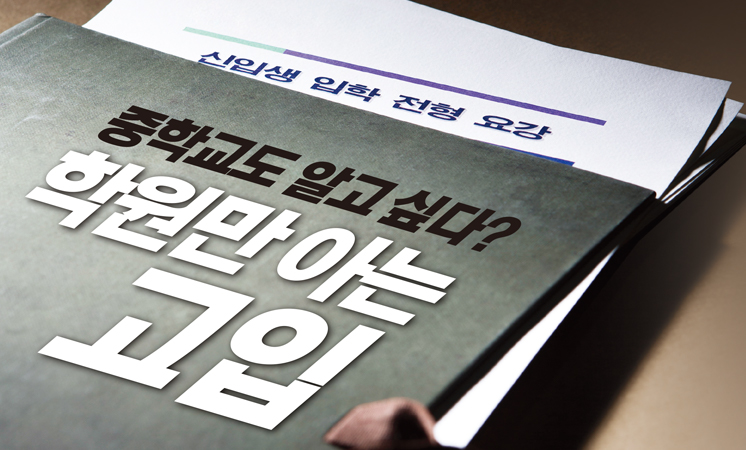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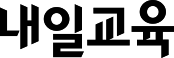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