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피플&칼럼



나의 고교 시절을 돌아보면 진로와 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었지만 반대로 무엇을 해도 맞는 판단일까 하는 불안감에 대학 원서 마감 마지막 날까지 고민했다. 결국 내가 선택한 학과는 토목공학(현재 명칭은 건설 및 환경공학과)이었다.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아닌 토목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때까지 즐겼던 블럭 장난감 때문이었다. 선택에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현재 내가 배우는 것을 즐기는 중이다.
탈토목공학? 공학의 기본 중 기본은 토목공학!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시설물 안전에 관한 보고서와 향후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기존 시설물을 더 오래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토목공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했다. 인재들의 집합소라 불리는 카이스트도 2018학년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신입생이 단 3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탈토목’이라고 해도 토목공학 졸업을 앞둔 내가 보기에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토목공학은 공학의 기본 학문이기 때문이다. 토목공학 전공자는 항공우주학과, 기계공학과 등 다른 분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취업 역시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 한 예로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센터인 NASA에서는 요즘 토목 계열 프로젝트가 활발한데 그 이유는 화성과 같이 다른 행성에 연구센터를 짓고 연구원을 보내기 위해서다.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주요 학문 중 하나로 여겨지는 기계공학도 사실 토목공학에서 파생됐다. 기계공학과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전공 과목이 많은 것만 봐도 비슷한 점이 많은 학문임을 알 수 있다.
노후한 사회기반 시설 토목공학의 영역
두바이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건물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나 또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하는 구조기술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고 들려온 소식은 2020년 이후 두바이가 건설 사업을 대폭 줄인다는 것과 국내 건설 산업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토목공학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이 대체로 노후하기 때문이다. 시설물이 노후하면 보수나 재건축에 앞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데, 이는 토목공학의 영역이다. 최근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센서가 구조물에 설치돼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졌고, 잦은 지진 발생도 토목 공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사실 토목공학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람들은 흙과 돌로 집을 짓고 살아왔고 상징적인 종교 건물을 지었다. 현대에는 서로 경쟁하며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모습만 봐도 토목공학의 사회적 수요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개발할 땅이 많기에 토목공학 전공자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실제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건설 회사나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비슷한 각주의 부처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률은 높으나 사람들의 인식은 글쎄?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토목공학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학문은 아니다. 토목공학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눈에 띄지않게 존재하는 전공이기에 인지도도 떨어진다. 토목공학자의 잦은 출장과 공사장의 업무 환경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한자로 풀면 흙 토, 나무 목, 장인 공, 배울학인 토목공학과라는 명칭을 최근 건설환경공학과로 변경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학과명이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처럼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전공명이 바뀌었다고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현재 추세는 토목공학을 역학에 중점을 맞춘 건설공학과 하천 해양 공기 토양 등을 관리하는 환경공학 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분위기다. 실제 내가 다니는 대학 역시 전공명이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건설환경공학)이지만 나는 Civil Engineering(건설공학)을 공부한다. 따라서 학위를 받을 때는 건설공학만 명시된다.
토목공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 토목공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미국인들은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 대화의 이면에는 ‘힘내라’ ‘취직은 잘되겠지만 일은 힘들겠네’ ‘그래봤자 공사장’이라는 뜻이 숨어 있기도 하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근무 환경을 떠나 우리는 토목공학자가 설계한 집에서 살고, 그들이 만든 길과 다리를 건너며 그들이 지은 건물에서 공부하고 일을 한다. 그러니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연구하는 토목공학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며 공부해도 좋지 않을까?

1. 건축을 배우고 싶어 2016년에 복수전공을 선택했다. 설계 수업에서 내가 디자인한 건물의 모습이다. 학기말에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2. 최근 3D 프린터를 건설 분야에 접목하는 움직임이 있다. 실험실에 있는 3D 프린터.
3. 2017년 미국 ASCE가 주관하는 Steel Bridge Design Competition에 참가해 2등에 오른 철제 교량이다. 교량에 센서를 달아 변이를 측정하고 건물의 구조적인 정보를 얻는다.
4. 교량의 도장 두께를 측정하고 부식을 탐지하는 드론이다. 아직 개발하는 단계다.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승제(토목공학) spark670@gatech.edu
- GLOBAL EDU 유학생 해외통신원 (2018년 12월 19일 88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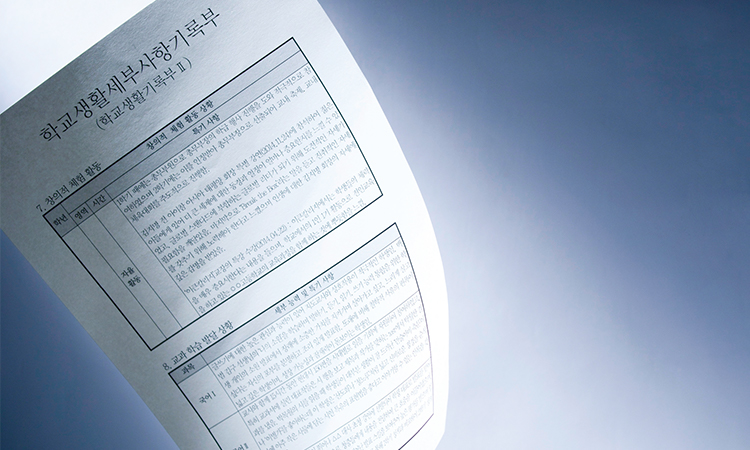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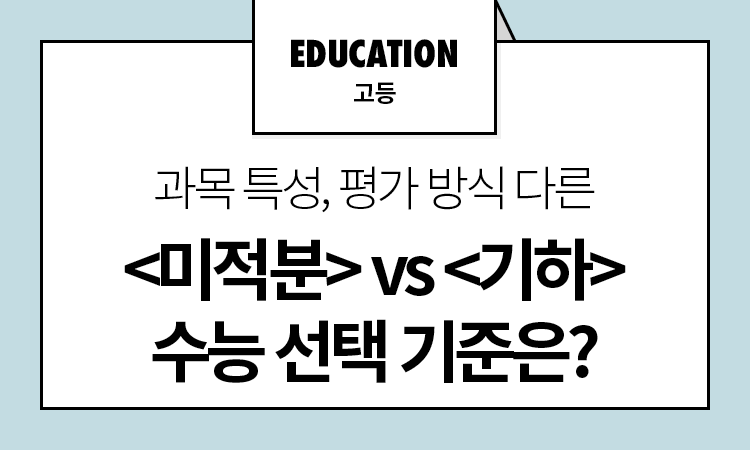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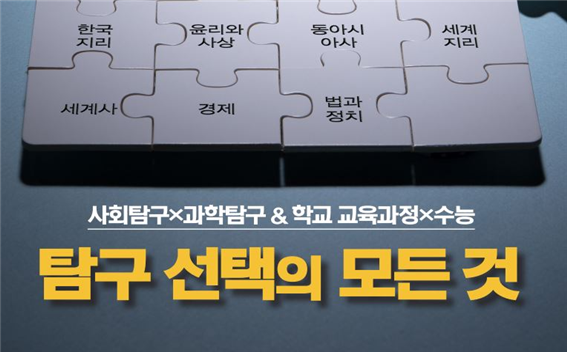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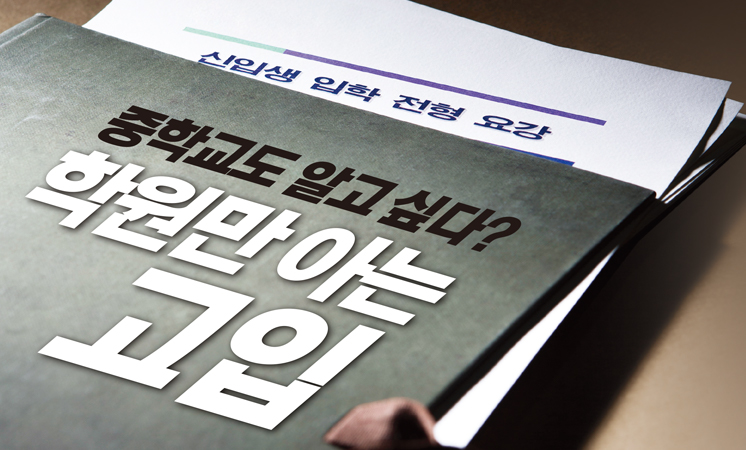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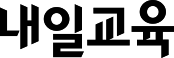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