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위클리 뉴스
‘점수로 평가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싶지만 표준점수라는 녀석은 대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준점수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합니다만 영 못 갈 길도 아닙니다. 최대한 편하게 모셔드릴 테니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찬찬히 따라오세요.
취재 황혜민 기자 hyemin@naeil.com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EBSi
| |

표준점수를 이해하기에 앞서 원점수를 알아야 합니다. 원점수란 말 그대로 정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를 합한 겁니다.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은 순도 100%의 점수죠. 모든 학생의 원점수를 쭉 늘어놓으면 가장 많은 학생이 몰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평균이죠. 양 끝으로 갈수록 학생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원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종 모양이 됩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수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만큼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한 학생의 점수가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에는 비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잔인하지만 그러합니다. 평가와 비교가 꼭 필요하다면 기준은 반드시 공정해야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각 영역과 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원점수로는 개인 간 상대적인 비교나 개인의 영역 혹은 과목 간의 비교는 어렵기에 표준점수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가 홀로 떠나니 남과 비교는 그만, 정답은 없으니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게 백 번 맞습니다만 아쉬워도 표준점수를 이해할 땐 이 생각은 잠시 내려놓기로 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표준편차가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편차는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죠.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평균보다 높은 점수이고, 안타깝지만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반대입니다. 표준편차는 편차 제곱평균의 음이 아닌 제곱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편차를 이용해 계산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표준편차는 표준점수를 계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솔메이트입니다.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표준점수이니 여기에 집중해봅시다.
시험은 공정함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백이진 학생은 <생활과 윤리>, 김주원 학생은 <정치와 법>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해 <생활과 윤리>는 어려웠고 <정치와 법>은 쉬웠다면 각 시험의 난도가 다르기 때문에 50점 만점에 두 학생이 똑같이 40점을 받았더라도 백이진과 김주원의 성적이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원점수만으로 평가한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정치와 법>에 많은 학생이 몰릴 테고, 집단 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는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기에 백이진보다 김주원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삼천포로 잠깐 빠지면, 일반적으로 과학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보다 난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물리와 화학의 난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려 자연 계열 학생이 인문 계열로 교차지원을 하거나,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 (전문 용어로 ‘사탐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험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불리한 장애물을 치워주고, 쉬운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는 허들을 한두 개 더 넘게 해서 두 사람이 치른 시험 난도의 간극을 최대한 메워주는 거죠. 이때 조율을 도와주는 마법 지팡이가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앞선 설명을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면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각 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이 모인 집단은 모두 다를 테지만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니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 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바꾼 점수죠.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2025학년 수능 탐구 영역은 임의로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조정해서 표준점수를 구합니다(표 1).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상대평가 영역과 과목에는 표준점수 산출이 필연입니다. 너와 나의 끊을 수 없는 연결 고리 같은 거죠. 참고로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기재되지 않고 표준점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자세한 공식을 알고 싶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로 고고.
이 공식에 따르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평균이 낮아지면서 표준점수가 올라갑니다. 시험이 쉬우면 평균이 올라가면서 표준점수는 낮아지죠. 표준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등급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2까지는 9등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의 상위 4%까지는 1등급, 그다음 7%까지는 2등급을 부여합니다(표 2).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합산하는 국어와 수학 영역은 조금 더 복잡한 표준화를 거칩니다. 먼저 각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토대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해줍니다. 공통 과목의 원점수와 조정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각각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고, 각각의 배점 비율을 반영해 합산한 점수를 평균 100, 표준편차 20인 표준점수로 변환합니다. 장황한 설명 같지만 목적은 단 하나, 특정 선택 과목에 쏠리거나 유리 혹은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거죠.
모든 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듭해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과정, 정말 복잡하죠? 1점에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다 보니 좀 더 유리한 선택 과목을 고민하기도 하고 실제로 탐구 영역에서는 치열한 눈치 게임과 고민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많은 합격생이 이야기하는 비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혜민 기자 hyemin@naeil.com
- 이 주의 입시 용어 풀이 [ 이용풀 ] (2025년 03월 12일 117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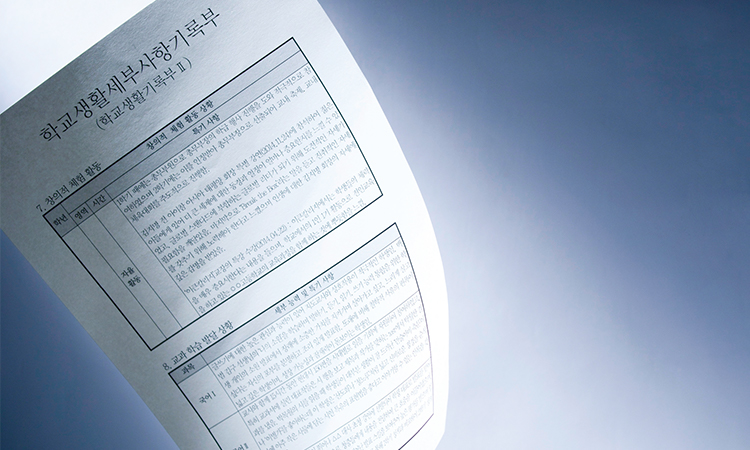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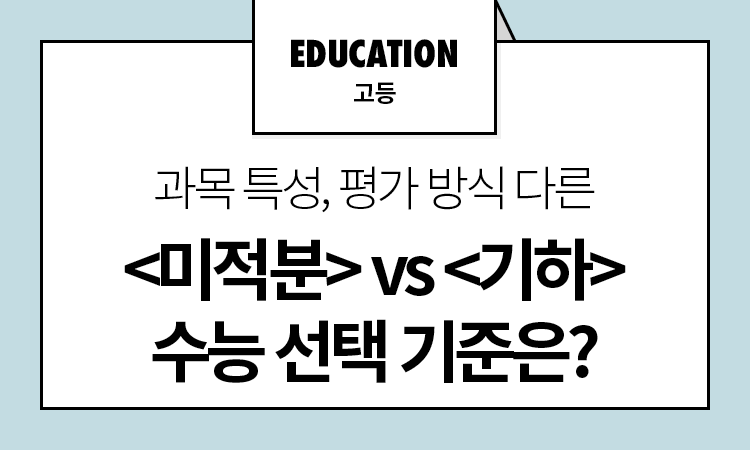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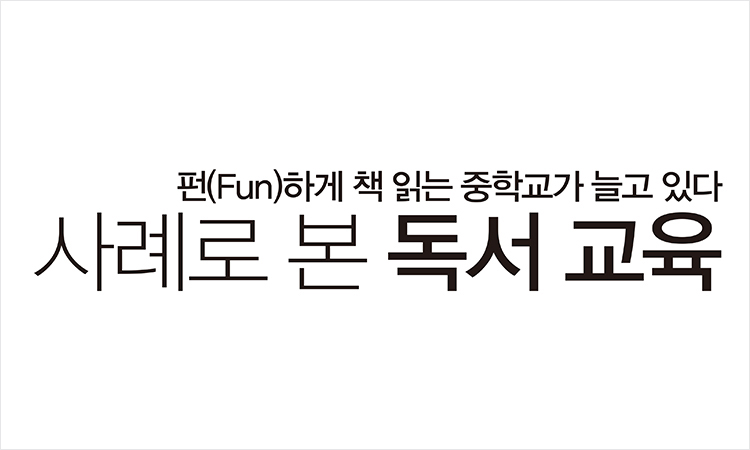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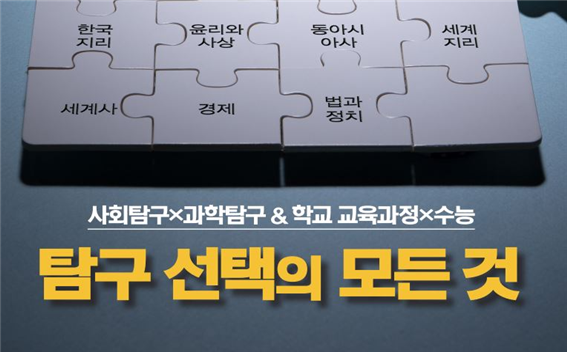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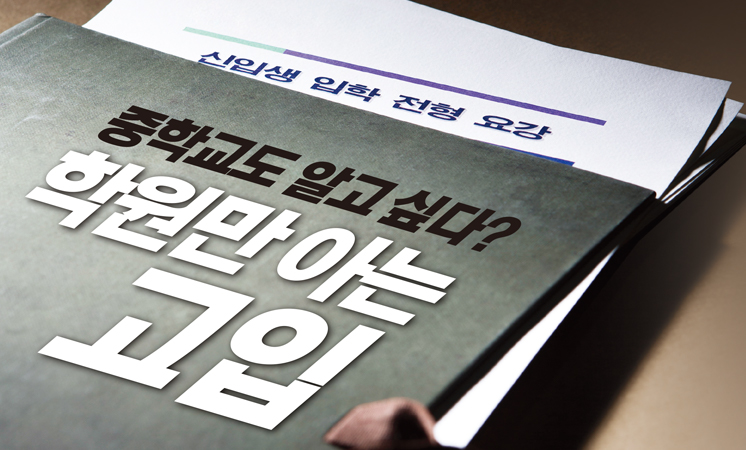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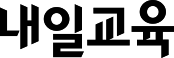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