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피플&칼럼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거 힘들지?”
유학을 하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부딪혀볼 만하다. 고되고 아득한 행군에서 정상이 눈에 보일 때 힘이 솟아오르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차이처럼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땅이 꺼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낀다.
프랑스도 동양인 여성은 힘들다
국적을 취득하거나 오랜 시간 살아도 타고난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다. 물론 인종의 용광로나 다름없는 파리에서는 차별이 덜하다고 한다. ‘아랍인이 싫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별이 덜한 정도는 공동체가 가진 힘에서 비롯된다. 남성의 분노가 여성의 분노보다 영향력이 크고, 공동체에 소속된 흑인이나 아랍인의 항의가 동양인보다 울림이 강할 수밖에 없다. 세력의 서열 관계를 따져봤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대상은 바로 동양인 여성이 아닐까?
동양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숨 쉬는 공기처럼 도처에 숨어 있다. 이곳의 남성들은 아시아계 여성을 포르노 배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편견과 판타지가 프랑스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나로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다.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운전사가 “마사지는 해주고 오냐”며 넌지시 물었다. 벌건 대낮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너는 얼마냐”고 묻는 이도 수없이 만났다. 파리 1대학에서 첫 학년을 보낼 때 내 볼에 입맞춤을 하는 교수까지 있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동양인 여성이 화를 내거나 완강한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프랑스가 여권이 강하기로 유명하지만, 아시아계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은 아니다. 아직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사회적 편견이 많다.
‘프랑스인’처럼 공부하기, 그들도 어렵긴 마찬가지
‘불어로 하는 암기식 공부’는 할 만하지만 프랑스의 익숙하지 않은 교육 방식은 여전히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학습의 의의가 한국과 다른 까닭이다.
특히나 철학과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다고 해서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질문 안에 숨겨진 모순을 파악하도록 자극하려는 목적이므로, 물음을 던지는 행위와 모순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모두 학생의 몫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프랑스 학생들도 새로운 물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1학년 때 ‘유한과 무한’이라는 주제의 수업에서 처음 접했던 시험이 ‘유한(한계)이란 필요한가?’ 였다. 나는 ‘한계지움(lalimite)이 없다면 무한(l’illimite)만이 남는데 그것은 곧 혼돈(le chaos) 아닌가?’라는 방향으로 모순점을 찾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사회 속의 한계, 즉 법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힘의 필요성을 적었고 그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때 내가 대학에서 처음으로 썼던 글은 문법과 철자 실수가 가득해 읽기조차 힘들었지만 교수님은 질문에 숨은 모순을 찾으려는 나의 첫 시도에 높은 점수를 주셨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진 유학생으로서의 약점은 진짜 약점이 아님을 깨달았다.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를 통해 프랑스 학생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한국과 프랑스 속 제3의 정체성
오랜 외국 생활을 경험한 한국 사람이 풍기는 낯선 느낌이 있다. 한국인들과 다른 사회에서 자아를 만들어가며 따라오는 절단된 시간의 흔적 때문일 것이다. 낯설음과 익숙함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타지에서 ‘이방인의 낯선 시각’이 오히려 본질을 제대로 꿰뚫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낯섦은 때때로 공포로 다가온다. 공포를 이겨내고 사회에 완벽히 녹아들어 익숙함을 찾을 수도 있다. 나는 익숙함에 기대어 안정적으로 삶을 이끌어나가면서도 프랑스인들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시각을 추구한다.
하지만 균형 잡기가 쉬운 일이었다면 서양과 동양의 철학자 모두 2천500년전부터 ‘중용’을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제3의 정체성. 가장 익숙한 한국 사회가 내게서 점점 멀어짐과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프랑스 사회는 내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가끔씩 피로가 몰려와 어느 쪽이든 고꾸라지고 싶은 현기증을 느낀다.
보통 유학 생활이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익숙한 사회를 벗어나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유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추진력과 동시에 좌우, 그리고 내가 걸어온 뒤까지 동시에 살필 줄 알아야 기대한 바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그토록 희미해지는 장소에서 ‘나’를 지켜내는 일. 더 멋진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에 나는 오늘도 전진 중이다.

1. 한국에서 이번 방학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왔다. 도시의 바캉스를 즐기는 세느강변의 파리지앵들.
2. 유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체류증 연장하기. 심사를 받으며 떨던 기억이 난다.
3.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어준 고양이 쵸프.
4. 고되고 지칠 때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바르셀로나에서.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진 (철학) sirongsae@gmail.com
- GLOBAL EDU 유학생 해외통신원 (2018년 09월 05일 8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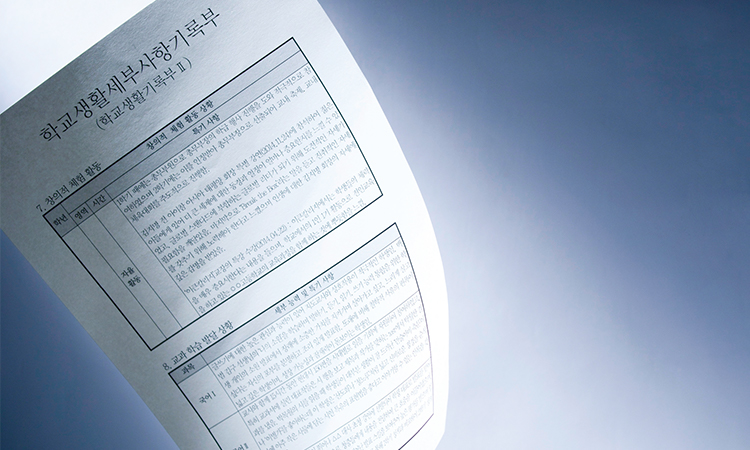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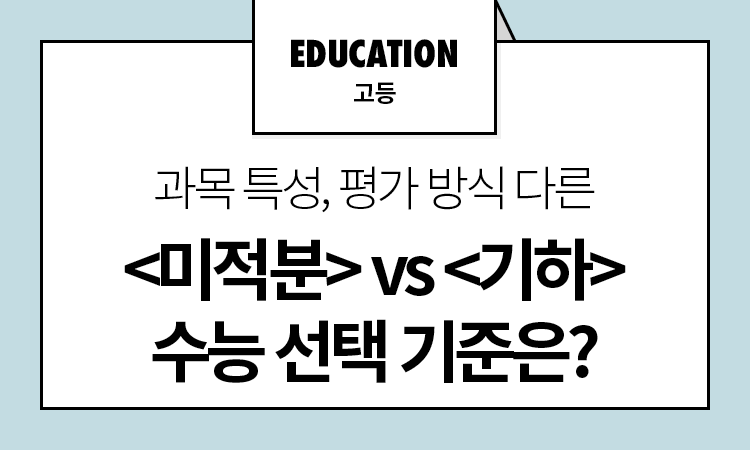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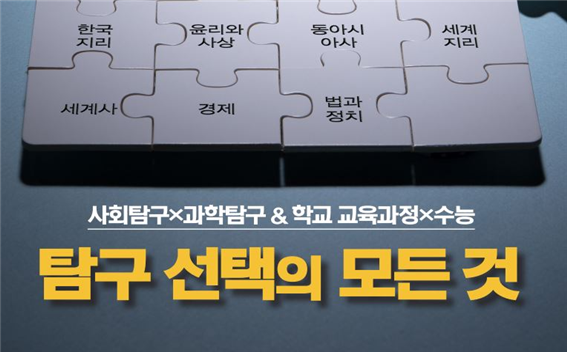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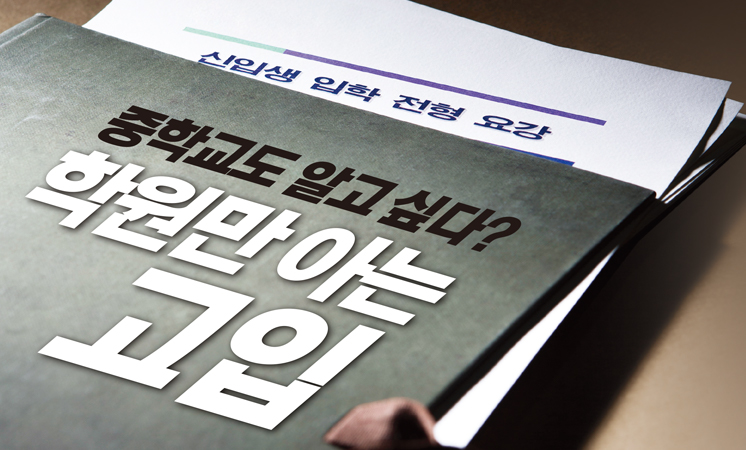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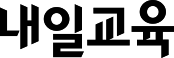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