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생활&문화
글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 |
‘인생이 심심하면 아들을 낳으라’라는 말이 있죠. 전혀 심심하지 않았던 나이, 스물일곱에 아들 엄마가 돼서 20년을 파란만장(?)하게 보내고 어느덧 대학생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이어진 둘째, 딸! 첫째를 키우며 쌓은 시행착오 덕분에 둘째는 문제없겠지 싶었는데…. 큰 착각이었어요. 카톡 이모티콘 쓰는 법부터, 어느 지점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지, 사춘기를 통과하는 방식까지…. 아들과 딸이 달라도 너무 달라 20년 경력의 엄마인 저도 여전히 뚝딱거립니다.
나 밥 안 먹어 VS 오늘 저녁 뭐야?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집 안 기온은 ‘삼한사온’만 돼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아들은 한바탕 부딪히고 나면 며칠은 냉각기를 각오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슬그머니 다가와 묻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먹는 것에 늘 진심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끼니를 거르는 적이 없었던 아들이라 때론 ‘엄마가 심했던 것 같아’라는 말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최애 메뉴를 들이밀면 금방 풀렸죠. 한동안 집에서 부르는 아들의 별명은 유행가 제목인 ‘밥만 잘 먹더라’였어요.
하지만 딸은 다릅니다. “밥 생각 없어.” 이 한마디면 맛있는 메뉴 화해법은 통하지 않아요. 대신 ‘대화’가 정답이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으며 ‘사춘기’로 치부했던 속 깊은 고민을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먼저 사과하기도 하면서요.
고등학교 학부모 총회날
아들의 고1 학부모 총회 날. 아들 학교에 도착할 무렵,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야? 어느 길로 와?’ 사춘기가 절정이던 아들의 반가운 문자에 ‘응 벌써 교문 통과해서 강당으로 가는 중~ 아들은 어딘데?’라고 물으니 ‘학교 나왔어’라는 답이 왔어요. 집에 돌아가 문자를 보낸 이유를 물으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엄마 마주칠까 봐’라고 하네요. 예상치 못한 답에 웃음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3년 뒤 딸의 고1 학부모 총회 날, 딸은 정문 앞에서 잠시 엄마 얼굴 본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교실에 들어서니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엄마, 여기가 내 자리야, 자리 못 찾을까 봐^^ 책상 안에 학부모 총회 자료집 넣어뒀어.’ 사춘기 때 친구들 앞에서 ‘다정한 아들’이면 큰일나는 아들과, “우리 엄마야~”라며 스스럼 없이 소개하는 딸의 온도 차는 100℃였어요.
화내는 아들, 우는 딸,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하렴…
중간·기말고사 첫날 시험을 잘 보면 의욕 뿜뿜, 내일 시험도 잘 보겠다며 ‘열공’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흐뭇합니다. 한데 망친 날이 문제죠. 화를 버럭 내고 “정시로 갈 거야~ 이미 망친 시험, 이제 공부 안 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라고 밥 먹듯이 내뱉던 아들. 아들이 대학을 가니 저도 내신 기간의 고통에서 해방된 듯했어요.
한데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또다시 ‘내신 전쟁 시즌 2’ 시작. 딸은 시험을 망치면 조용히 방문을 닫고 울어요.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어느새 저녁.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하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삼킬 수밖에 없죠. 시행착오 끝에 모든 과목 시험이 끝난 후 채점하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옛날 사진만 보면 눈물이 핑~
어린 시절 어디든 손 꼭 잡고 따라오던 남매는 사라지고, 요즘 우리 집 남매는 하루 한두 마디도 섞을까 말까 하는 빙하기예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어머니께 고민을 얘기하니 우문현답이 돌아옵니다. “기다려. 기다리면 돼!”
기다림. 쉽고도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에 독감에 걸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 내가 동생 학원 앞으로 갔다가 간식 좀 사주고 데리고 올게” 하더니 남매가 함께 집에 왔어요. “아픈 보람(?)이 있네~” 하며 씽긋 웃었습니다.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 리포터의 창 (2025년 11월 26일 12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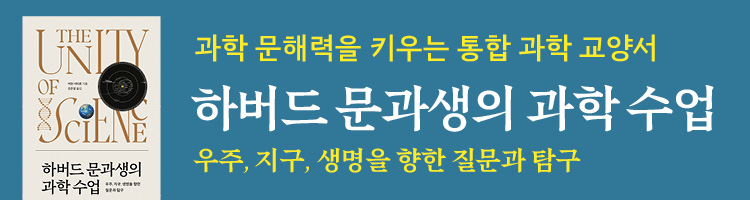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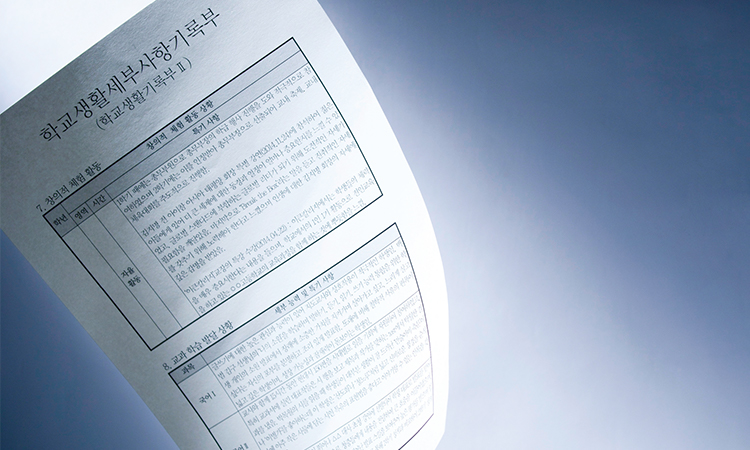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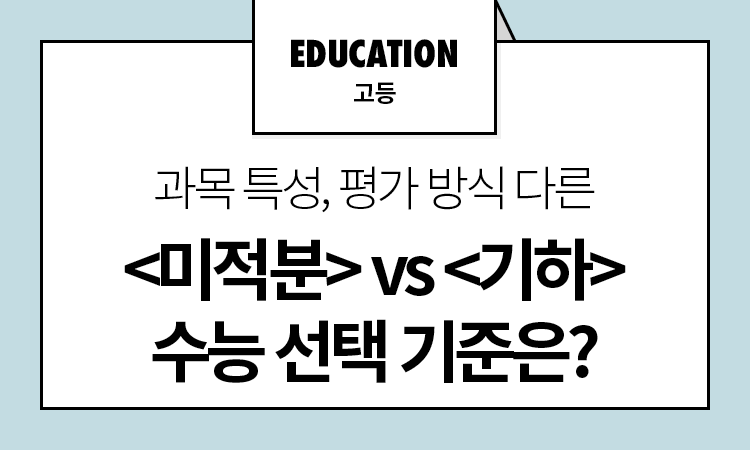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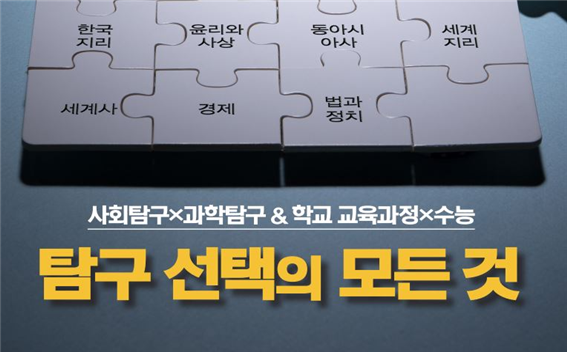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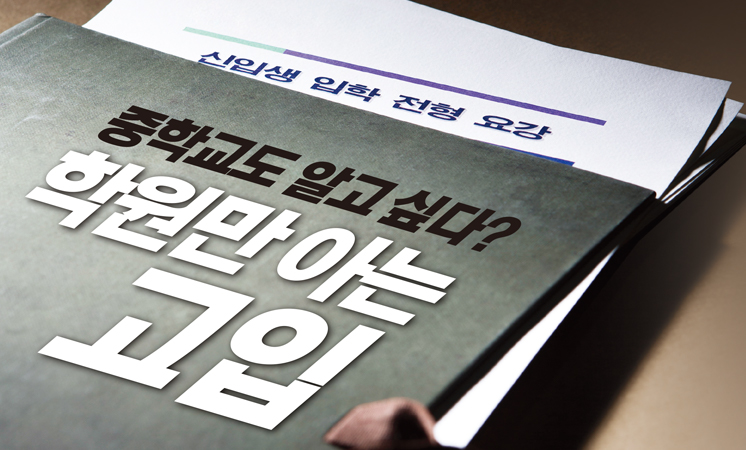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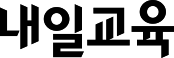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